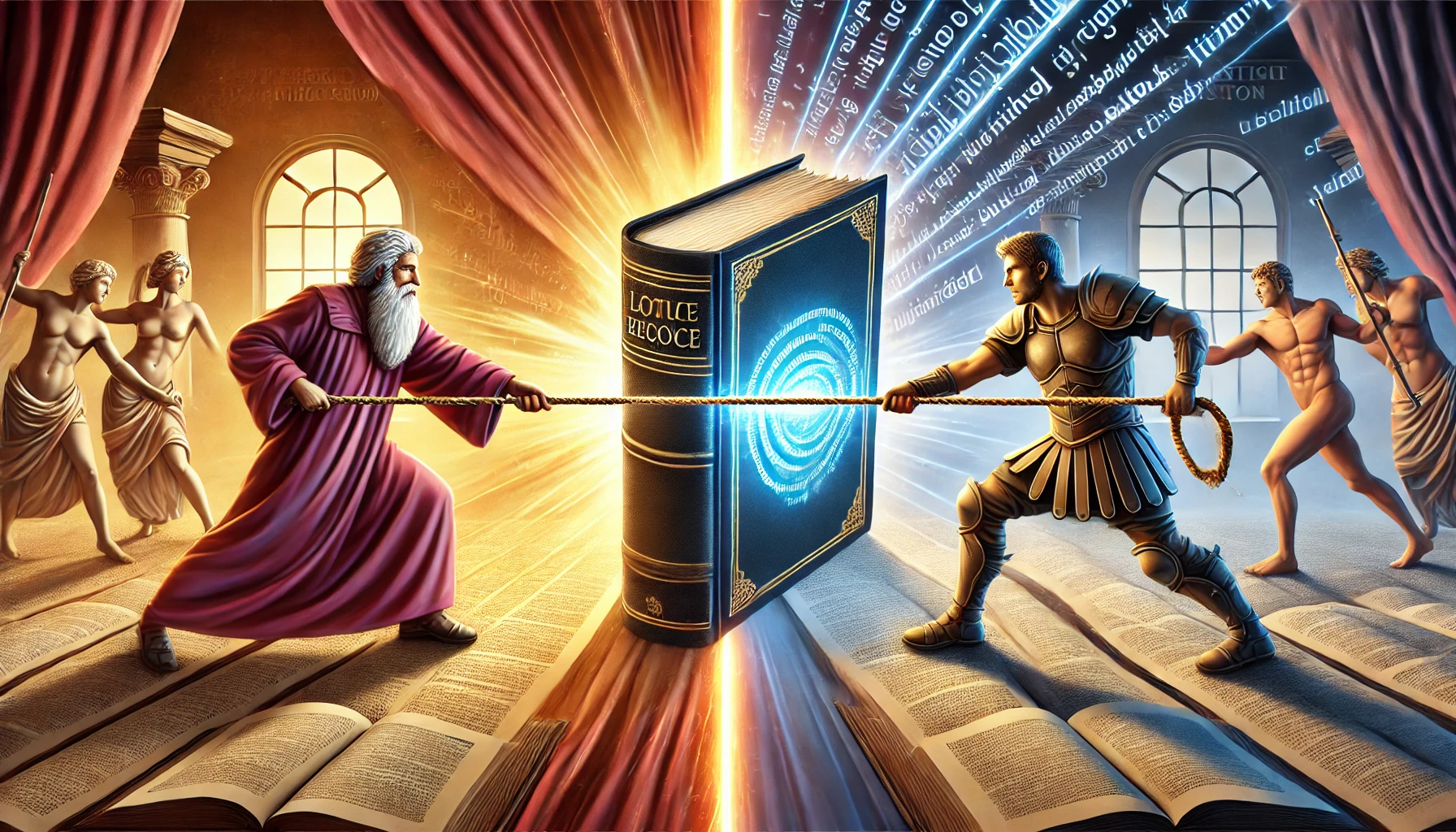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이 묶여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일본의 침략부터 한양 함락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속수무책이란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력하게 상황을 맞이하는 상태임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한자급수 3II급束手無策묶을 속손 수없을 무꾀 책1592년 4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침략을 개시했습니다. 일본군은 상륙 직후 조총을 앞세워 부산성을 단숨에 함락시키고, 승기를 잡자 곧바로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조선군은 예상보다 빠른 적의 공격에 당황하..